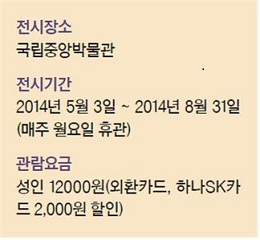‘오르세미술관전 - 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
|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오르세 미술관. 19세기 이후 프랑스 문화를 담아내는 이 공간의 축소판이 한국에 펼쳐졌다. 최초로 한국땅을 밟은 175점의 작품들이 19세기 인상주의 미술과 파리의 사회상을 생생히 그려낸다. 화가 내면의 변화와 파리 문화의 흐름을 느껴보라는 김승익 학예사의 조언과 함께 ‘오르세미술관전 - 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 전을 찾았다. |

전시장을 들어서자 새하얀 유럽풍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수줍은 미소로 관객을 맞이한다. 머리 위에 하늘하늘한 양산을 들고 봄날의 정원에 서 있는 그녀는 함께 이곳을 산책해보지 않겠냐고 은밀히 말을 건넨다. 그녀의 미소에 화답하며 전시장 깊숙이 고개를 돌리자 여인이 살았던 시간이 펼쳐진다.
태동하는 파리에서 찰나의 순간을 담다-인상주의
전시장 벽면에 나타난 19세기 파리의 영상. 당시 파리는 근대도시를 향해 태동하던 시기였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리, 화려한 조각상이 장식된 건물들. 19세기 파리에 발을 내딛자 순간 주위는 파리 번화가로 변모한다. 관객을 둘러싼 전시장 양쪽 벽면엔 빅터 발타르의 ‘생 오귀스탱 성당’이 서 있고, 귀족 부부는 새로 생긴 오페라 극장을 가기 위해 마차에 탄다. 그림 속 귀족 부인의 풍성한 드레스와 어깨에 덮인 숄은 1800년대 파리의 일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런 파리의 활기찬 모습을 그리고자 했던 인상주의 화가들. 화가들은 성당 앞 길바닥에 앉아서, 혹은 항구 옆 절벽 위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린다. 모네는 막 비가 갠 강가에 앉아 깨끗하게 내리쬐는 햇볕의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다. 일렁이는 강물에 비친 햇살을 담기 위해 그는 쉼 없이 붓질한다. 순간순간 눈에 비친 오묘한 색깔들. 찰나의 색채가 힘 있게 전달된 그림 속에서, 그가 포착하고자 했던 따뜻함이 강물 위에 반짝인다. 모네는 자리를 옮겨 ‘보르디게라의 저택’ 앞에 선다. 하지만 그에게 저택의 형태는 중요치 않다. 캔버스를 압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택 앞의 붉은 꽃나무. 숨 가쁜 붓질로 하늘 높이 뻗어 나간 생명의 줄기가 강렬한 인상을 준다.
반대쪽 벽면엔 단 하나의 그림만이 걸려있다. 그림에 표현된 것은 템스 강과 그 너머에 서 있는 국회의사당. 하지만 모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템스 강을 둘러싼 공기의 아름다움만이 그의 가슴을 울린다. 액자와 관객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100년 전 촉촉한 대지의 향을 전달한다. 해 질 무렵 아련한 대기 속에서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모네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본다.
간질거리는 가슴을 뒤로하고 멈춘 곳은 한 소녀의 초상화 앞. ‘양산을 쓴 여인’은 지베르니 언덕 위에서 아버지 모네를 바라보고 있다. 딸의 애틋한 시선만큼 아버지의 시선 또한 사랑스럽다. 딸의 옷자락이 가볍게 흩날릴 때마다 아버지가 보는 지베르니 언덕의 구름도 사르륵 바람결에 흔들린다. 모네는 이 진심 어린 마음이 훗날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할 줄 알았을까.
작은 잉크 점에 담은 세상의 빛깔-신인상주의
순간순간의 빛을 즉흥적이고 불규칙한 붓질로 보여주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시대. 그 시대가 저물 무렵, 점으로 색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앙리 애드뭉 크로스의 ‘머리카락’에는 초록과 분홍, 보라색 점이 가득하다. 한 발 물러서자, 가까이선 색색의 점에 불과했던 그림은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빗는 매혹적인 여인으로 변한다. 점묘화를 창시한 조르주 쇠라는 포르탕 베생 항구로 갔다. 얇디얇은 점을 화면 가득 찍어 완성한 절벽 아래 항구의 모습. 쇠라는 그 모습의 테두리를 액자로 감싸는 대신, 직접 점을 찍어 테두리를 만들었다. 파란 바다에 맞닿은 테두리는 작은 점들이 모여 붉은 기를 내고 보트의 하얀 돛대에 닿은 테두리는 파란빛이 돈다. 수천 번의 섬세한 붓질이 누군가 씌워놓은 비싼 나무액자보다 더 조화로운 그림틀을 완성해냈다.

전시장에 걸린 수많은 화가의 점묘화는 그 점의 수만큼이나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낸다. 쇠라가 얇은 점을 촘촘히 캔버스에 찍어냈다면, 막시밀리앙 뤼스는 묵직하게 물감을 묻혀 강가에 만발한 꽃들을 풍성하게 담아냈다. 앙리 에드몽 크로스의 ‘난파’는 엄지손톱만 한 붓의 흔적을 통해 날뛰는 파도 앞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선박의 급박함을 전한다.
화려해지는 파리, 도시를 벗어난 천재들-후기 인상주의
전시장은 다시 파리의 사진과 드로잉을 선보인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철근 조각에 불과했을 당시의 모습이 인화지에 담겼다. 수많은 비난과 반대 속에서 탄생이 불투명했던 에펠탑. 그 위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부들의 땀이 모여 마침내 에펠탑에 붉은 조명이 켜졌다. 조르주 가랑이 그린 ‘1889년 만국박람회를 기념하는 에펠탑 조명’에서 주인공 에펠탑은 붉은 기염을 토해내며 웅장한 골격으로 파리 시내를 당당히 굽어본다. 애물단지였던 에펠탑은 100년 후 머나먼 이국땅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관객에게 가장 친숙하고 쉬운 작품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당시 화가들은 인간성이 사라져가는 근대 파리의 모습이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고갱과 고흐, 세잔 같은 후기인상주의 화가들은 파리를 등지고 원시적인 삶의 모습을 찾아 시골 마을을 찾았다.
고갱의 전시장 벽면에는 시골 전원의 모습이 가득하다. 처음 퐁타방으로 이주했을 때 그린 작품에서는 형태보다 색채를 나타내려 했던 인상주의적 붓 터치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머지않아 직관적인 붓 터치를 지우고 나타난 윤곽선. 노란빛 건초더미 사이를 가로지르는 검은 윤곽선은 농사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새로운 그림을 찾아 헤매던 화가들의 방황은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으로 끝이 난다. 파리의 문명을 벗어나 환상과 원초적인 자연을 담고 싶었던 그. 한 사업가가 들려준 뱀 부리는 주술사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한다. 왼쪽 하늘엔 달이 떠 있고 낮인지 밤인지 모를 원시림엔 열대수풀이 빽빽이 뻗어있다. 그리고 홀연히 나타나는 맨발의 검은 여인. 시커먼 뱀은 여인이 연주하는 피리 소리에 홀려 서서히 그녀의 몸을 감싼다. 식물원과 박물관에서 관찰한 기억으로 창조한 그의 우주는 오묘하고 아름답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인상주의. 찰나의 빛을 그림에 담아내고자 했던 화가들은 새로운 화풍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19세기로 안내한 하얀 드레스의 여인과 마지막을 장식한 뱀을 부리는 여인. 피부색부터 자아내는 분위기까지 닮은 구석 하나 없는 이 작품들처럼 전시장의 작품은 모두 자기만의 빛을 내며 걸려있다. 그 수많은 화폭은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바래지 않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