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읽은 책-<결정장애 세대>
기자명
김보라 기자 (togla15@skku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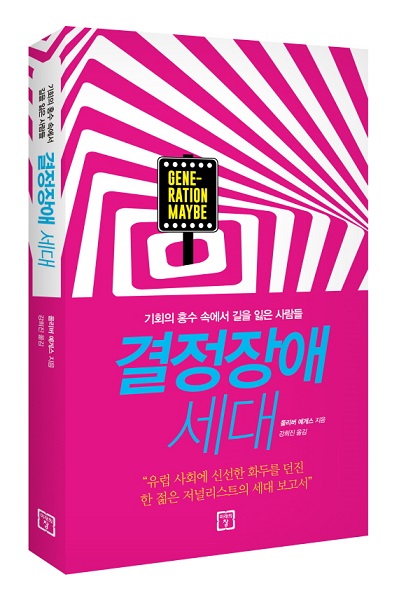

“우리는 병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결정장애 세대(Generation Maybe)다.” ‘결정장애 세대’는 독일 저널리스트이자 도서 <결정장애 세대>의 저자인 올리버 예게스(Oliver Jeges)가 2012년 ‘디 벨트’ 칼럼에 처음 써 유럽 전역에서 대중의 관심을 끈 단어다. ‘결정장애’란 자기 결정이 부족하고 어정쩡한 특징을 가진 20,30대들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 결정장애란 단어가 있었다면 소심한 사람들의 우유부단한 개인의 모습을 지칭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성격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결정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는 ‘지연 행동’이다. 지연 행동이란,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불편한 마음에 당장 시작해야 할 일 혹은 끝마쳐야 하는 일을 되도록 미루는 것을 말한다. 지연 행동을 게으름과 혼동하기 쉽지만, 이는 다른 개념이다. 게으름과 지연 행동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게으름이 단순히 나태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연 행동은 역설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마음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학 용어를 빌려 결정장애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정장애가 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 젊은 세대가 결정을 내리는 게 힘들어진 이유는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다. 현재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그 어떤 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젊은 세대에게 수많은 데이터에 의한 여러 선택지가 제공됐음에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가정과 사회, 심지어 가치관까지 안정된 것이 없다. 평생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됐으며, 결혼 상대도 ‘평생 배필’이라는 의미에서 ‘인생의 한 단계를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변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찾아오는, 이른바 ‘풍요 속의 공허함’도 바로 이 불확실성에서 나온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틈틈이 밀려오는 공허한 마음은 이 시대의 20,30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이에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심심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어린 시절부터 ‘내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는 개인주의에 익숙해진 그들은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알기 때문에 결정하기를 꺼린다. 여러 곳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잠시 도피하는 것이다.
흔히 결정장애 세대의 문제점으로 △집중력 부족 △상식의 비상식화 △정치적 무관심 △SNS의 이면이 꼽힌다. 4분짜리의 짧은 연설도 지겹게 여기는 청년들은 몇 개의 해시태그만으로 세상에 자신을 표현한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개인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세상은 분 단위,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 써야 할 만큼 빨리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단 한 장의 사진이나 몇 글자의 글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낸다.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만 주고받는 것은 진정한 교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속해서 빠른 것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진정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빠른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오래 집중하는 법’을 잃게 한다.
기성세대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무식해’라며 한탄하는 것은 ‘상식의 비상식화’ 현상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홀로코스트’라는 용어 자체를 모른다는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혀를 찬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예지만, 교육의 방향은 시대마다 새로이 설정돼야 한다. 시대에 따라 필요한 상식도 달라진다. ‘클릭 몇 번이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현세대에 피카소와 브라크의 그림 양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정치적 무관심 또한 젊은 세대의 특징 중 하나다. 주관 없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 중심에 서 있는 젊은 세대는 정치적 입장을 뚜렷하게 가지지 않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정치에 아예 무감각한 세대는 아니다. 그저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가 정치 상황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비난만 받는 상황이 무서워 ‘수동적 공격자’가 되기를 택한 것이다. 즉,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정치적 무관심’을 택한 것이다.
SNS 또한 젊은 세대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다. 그들의 SNS 의존성을 ‘나는 포스팅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SNS는 그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과 소통하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SNS는 우리 안에 있는 강렬한 표현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SNS의 파도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교감은 어렵다. 결국, SNS는 인간관계를 도와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인관계를 잠재우는 괴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고,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과거에는 그래도 음악을 들으며 파티를 즐길 여유라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젊은 세대는 그럴 여유가 없다. 완전히 다른 문제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은 지금의 즐거움에 있지 않다. 그들이 그동안 진리로 여겼던 것들까지 선택의 영역에 놓였으며 진리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사고가 만연해졌다. 모든 게 불확실한 현시대에 누구도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그저 행복의 결과물이 아닌 행복을 갈망하는 과정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갈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