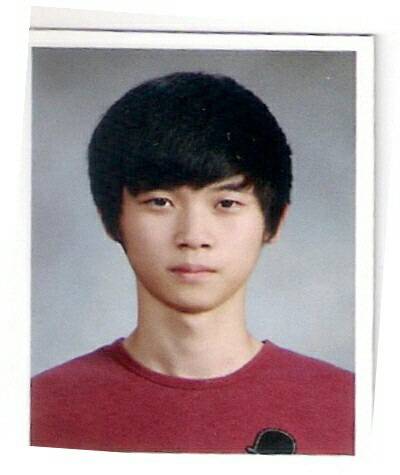지난해 1학기에 성대신문사에 들어와 벌써 기자 활동을 한지 1년이 흘렀다. 작년 1학기에는 수습기자로서 신문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기사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배우는 단계를 거쳤다. 본격적인 신문사 업무를 시작한 건 준정기자로 활동했었던 2학기 때부터였고 내가 소속된 부서가 보도부인만큼 내가 쓰고 싶은 기획이나 직접 준비한 기획보다는 축제나 연석중앙운영위원회 등 연례적으로 주어지는 기사만 썼었다. 또한 준정기자 때는 학우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나 학교의 제도적인 문제들을 짚어주는 문제기사도 써야했다. 학교의 문제점을 취재해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였고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내가 왜 별로 쓰고 싶지도 않았던 기사를 배당받아서 써야하는지, 그리고 내가 문제기사를 쓴다고 해서 학생들이나 학교가 그것을 읽고 학교가 바뀌어나갈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또 부서장이라고 해서 직접 기사 작성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쓴 기사를 검사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았었다. 결국 이는 신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애정의 부족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은 3학기 째에 접어들었고 한낱 준정기자였던 나는 보도부 정기자에 부서장까지 맡게 됐다. 이제 내 기사를 체크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쓴 기사가 짧은 시간의 교열만을 거쳐 바로 기사가 된다. 처음에는 책임감을 많이 느꼈지만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갈수록 정신이 해이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 하나 나에게 기사에 관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검사를 받아야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자료를 편하게 구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앉은 자리에서 기사를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다. 결국 이번 호에는 위에 말했던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선거시행세칙’과 ‘러닝메이트제’에 관한 기사가 나간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했지만 이러한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기사 완고를 내기까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내가 쓴 몇 문장의 기사가 학교나 학생들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무리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기사를 쓰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이면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내 기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나 자괴감이 들어도 계속 좋은 기사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다보면 좀 더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