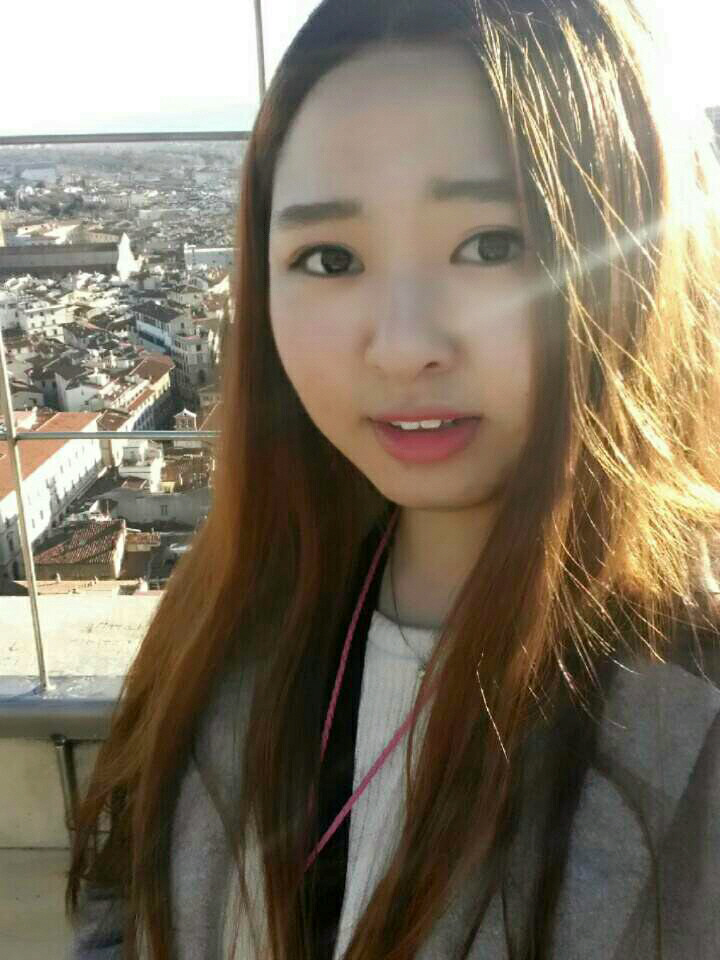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인정받는 길을 갈 것이냐. 어려서부터 늘 주위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고, 또 그에 너무 익숙했던 나는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갈림길에서 한참이나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4년 전의 나는 무대 연출이 하고 싶었다. 비록 나에게 걸린 기대를 저버릴 자신이 없어서 예술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허무하게 포기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꿈만은 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고민한다. 괜찮은 대학에 왔으니 그럴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평균치의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런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일까? 꿈을 좇다가 단칸방을 전전하며 가까스로 끼니를 때워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즐거워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매일을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제이쓴을 만났다. 사실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이 방송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던 탓이다. 맨얼굴의 그는 유쾌한 옆집오빠 같았다. “저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이제는 좋아하는 바로 그 일로 돈까지 버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그의 이야기에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자신이 있는 사람은 어찌나 빛나던지. 용기가 없어 자꾸 현실과 타협하려는 내가 가여웠다.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쉽게 지면에 싣지 못한 그와의 대화를 조금이나마 옮겨 적어본다. 기자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취재를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배우는 게 많지만 이번의 만남은 내게 있어 조금 더 의미가 깊었다. 두어 시간 남짓한 대화를 통해서 나는 다시 두근거릴 수 있었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라며,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