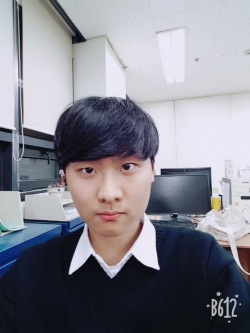미세먼지가 종종 하루를 망치는 여느 봄날과는 달리 맑은 하늘과 무더움이 가득한 4월의 주말이었다. 답안지에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을 뒤로하고 710번 버스에 카메라와 함께 몸을 실었다.
시민평화법정이 열리는 성산동의 문화비축기지는 버스종점에 가까웠다. 표준어와 사투리 경계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기자에게 월드컵경기장의 등 뒤에 폭 숨어있던 이곳은 생소하기 그지없었다. 독특한 외관이 눈에 먼저 띄었지만 명명 역시 예사롭지 않아 곱씹게 됐다. ‘문화’와 ‘비축기지’에 얽힌 사연이 있지 않겠냐는 물음에 입구의 한 안내판이 작은 실마리를 남겼다.
이곳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73년 오일쇼크 이후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져 마포 석유비축기지라는 이름으로 41년간 불렸다. 그리고 2018년 이곳은 그 봉인을 풀고 공연과 전시에 참여하는 문화공간이 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매봉산 땅속에 묻혀 있던 유류보관 탱크는 여전히 녹슨 채로 자리했다. 과거의 흔적을 땅 위로 고스란히 건져 올린 모양새였다. 탱크 안으로 들어서니 천장 그 조그마한 틈에서 쏟아지는 햇빛과 때 묻지 않아 매끈한 회색 시멘트가 오묘하게 비워짐을 채워주고 있었다. 탱크에 손을 대지 않았기에 나오는 고유한 아우라가 뿜어 나온 것이다.
석유비축기지를 ‘필요 없음’으로 정의하고 지워버렸더라면 이를 재생한 문화비축기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문화비축기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석유비축기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과거와 현재로 집약되는 두 건물의 존재 이유는 서로에게 있다. 현재가 과거를 부정할 수도, 과거가 현재를 규정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지금 한국에 베트남은 중국, 미국 다음의 3대 수출시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석유비축기지가 조성된 시기 한국에게 베트남은 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트남과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시민의 아이디어로 되살아난 문화비축기지가 응답한다.
석유를 비우자 사람들이 들어섰다. 문화와 비축기지가 온전히 하나가 됐고 시민평화법정은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