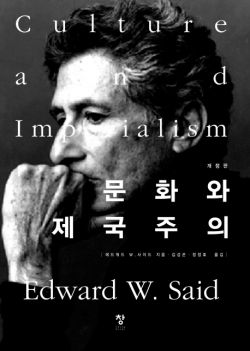
구미 문학 속 제국주의, 대위법적 독서로 발견할 수 있어
사이드, “서로를 분리하고 변별할 이유 없다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인. 이러한 그의 출신은 『오리엔탈리즘』과 더불어 문화와 제국주의를 저술한 에드워드 사이드가 역사 속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의 이름도 그 당시 대영제국 왕세자의 이름과 같은 ‘에드워드(Edward)’와 아랍계 성씨인 ‘사이드(Said)’로 이뤄져 있다. 스스로 ‘망명객’이라 칭하며, 동양과 서양이 합쳐진 그의 존재는 ‘둘 중 하나에만 속하기보다는 다른 두 세계에 모두 속한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이드는 1993년 발간된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문화가 어떻게 제국주의를 포장했고, 포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는 문학과 예술에 제국주의와 제국인들이 생각했던 식민지의 모습이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19세기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를 분석한다. 소설에 나오는 식민지 자산은 버트람 가족에게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주고, 소설의 다른 인물들도 식민지 자산의 가치에 동의한다. 이처럼, 구미(歐美) 문학 속에 녹아있음에도 묵인됐던 이데올로기를 찾기 위해 사이드는 ‘대위법적 독서’를 제창한다. 대위법적 독서는 글에서 강제로 배제된 것까지 읽는 독서법을 말한다. 만약 작가(제인 오스틴)가 제국주의 영국에서 삶을 유지하는 데 식민지 농장을 중요하게 묘사한다면, 그 의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며 읽는 것이다. 한편, 사이드는 “제국주의는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 미국 정책 형성이 과거 서구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미국의 일부 기업, 언론인, 지식인 등은 이에 협조하는데, 그는 “몇몇 초국적 기업들이 제조와 분배를 통제하고,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의존하는 뉴스 선택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와 그것을 떠받치는 오리엔탈리즘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이드는 근대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국수주의 또는 민족주의도 비판한다. 국수주의도 제국주의와 같이 이분법적 타자화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국적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대해 사람들은 ‘차이’를 근거로 타자를 억압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이드는 책에서 “오늘날 어떤 누구도 순수하게 하나이지 않고, △국적 △성별 △인종 △종교 등의 분류는 나중에는 의미가 상실되는 출발점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대안으로 다문화주의를 시사한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7만 9000명으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광주광역시 인구(146만 1203명)보다 더 많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만의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사이드는 “살아간다는 것은 사물들 사이에 관계를 짓는 것”이라 말하며 “하지만 그 관계는 타자를 통치하는 것도, 분류해 위계를 나누는 것도 아니며 자문화나 자국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 피할 수 없는 다문화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들을 ‘타자’로 보지 않는 태도다. 사이드는 제국주의가 남긴 최악의 그리고 가장 모순적인 산물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오로지 단일 인종이거나 단일 민족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오랜 전통과 언어 등은 무시할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을 분리하고 변별성을 강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차이’는 배제의 근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가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