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현대문화와 신화』 리뷰
신이 죽은 시대라고 한다. 과학과 기계문명이 선도하는 시대에 신비로움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신화는 “옛날 옛적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주술적인 이야기로 치부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신화를 무지의 산물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묻게 된다. 신과 영웅, 신비를 간직한 신화들은 현대에 와서 죽었는가? 책 『현대문화와 신화』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스 신화에는 위대한 건축가 다이달로스가 지은 미궁이 등장한다. 그는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복잡한 건물을 지었다. 상징들로 얽히고설킨 신화는 바로 이 다이달로스의 미궁과 같다. 미궁을 헤매며 출구를 찾듯, 사람들은 신화 속을 돌아다니며 상징을 해석해야 한다. 현대에 와서 신화라는 미궁은 더 복잡해졌다. 현대 문화는 신화의 원형을 드러내기보단 이야기 속에 신화의 상징과 신화적 이야기 전개를 은근하게 녹여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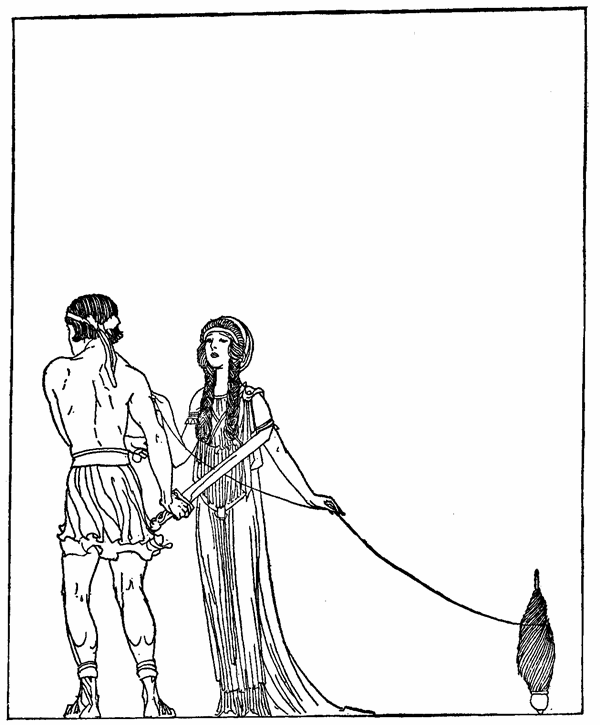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서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와 이카로스의 날개는 미궁을 탈출하는 방법이다. 『현대문화와 신화』는 현대문화 속 신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아리아드네의 실과 이카로스의 날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특정 작품들을 꼽아가며 현대의 △서사 △영상 △놀이에 투영된 신화성을 소개한다. 독자들은 익숙한 작품이 여럿 등장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일례로 고등학교 때 읽었을 법한 이청춘의 『서편제』가 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 유봉은 판소리의 명맥을 지키려고 한다. 딸 송화가 소리를 계승하기 바랐던 그는 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딸의 눈을 멀게 한다. 김동인의 소설 『광화사』의 솔거는 탐미주의자의 전형으로, 소경처녀를 죽이고 나서야 마음에 드는 미인도를 완성한다. 두 작품 모두 희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한’의 예술을 이야기한다. 이 주제는 아기를 용광로에 던져 에밀레종을 완성했다는 삼국유사 속 설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편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 영화 <원령공주>에는 자연과 인간의 대칭이라는 신화성이 등장한다. 이 영화는 인간들이 자연의 영역을 파괴해 둘 간의 대칭을 깨뜨리면서 시작한다. 결국, 하야오는 인간이 스스로 깼던 대칭 상태를 복원하고 자연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는다.




신화 속 상징들은 영원하면서도 변화무쌍하다. 이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의미를 만들거나 기존 의미를 변형한다. 본래 세계는 모계 사회였다. 대지모신 사상, 가령 가이아나 마고할미 신화가 이를 암시한다. 그러나 부계 사회로 세상이 변하면서 그에 맞춰 판도라나 헬레나같은 만악의 근원이거나, 수동적이고 헌신적인 여성상이 등장하게 됐다. 한편 현대에는 확고했던 신화 틀이 종종 전복되거나 비틀린다. <슈렉>과 종이 봉지 공주는 왕자가 어려움을 딛고 공주를 구해 행복하게 산다는 전형적인 모험담의 변형이다.
신화는 인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낸 이야기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산되거나 변형되면서 살아남았다. 저자는 이야기 속 신화를 읽어내기 위해선 현대인의 지적 호기심이 언제나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