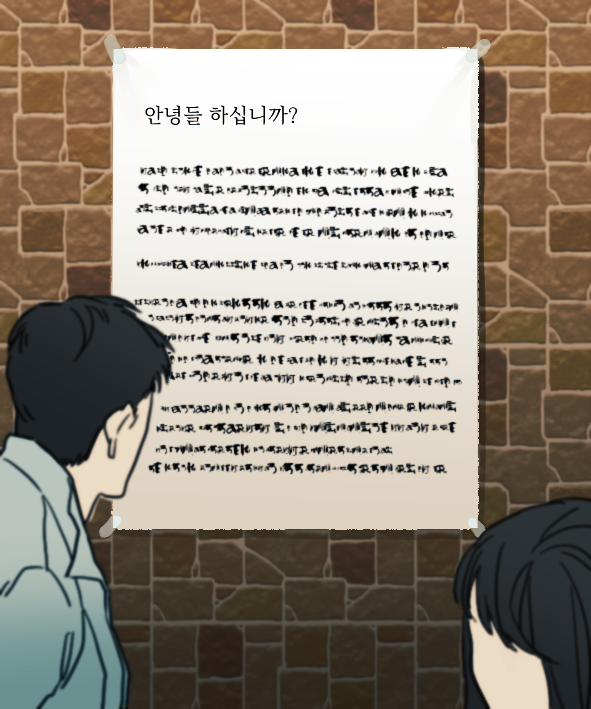
1984년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지금 20대에게는 어느 새 함께 차나 술을 마시며 ‘대학의 길’을 논하기에는 이미 불편한 세대가 되었다. 진리에 고금이 없듯이 학문을 논하는 것에도 옛날과 오늘은 없다고 믿고 있지만, 학문하는 ‘동향(動向, trend)’의 ‘오늘’과 ‘옛날’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방에서 인문학공부 열풍이 뚜렷한 추세(trend,동향)였을 때도 <대학> 삼강령[‘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이 과연 오늘날 대학(인)이 가야 할 길[道]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화두로 삼아 논해보자는 움직임은 없던 것으로 안다. 롤스(J. Rawls)의 ‘정의론’ 등이 출간되고 논의된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대중적 차원’에서 우리의 고전 <대학>을 이와 연계해 우리 대학현실을 성찰하고 그 길을 모색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글로벌시대에는 글로벌트렌드를 따라야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의 정(正)이라고 여겨지는 오늘날 ‘꼰대낙인’을 감수하고 이 정(正)에 ‘반(反)’을 거는 이런 위험한 논의는 무조건 비껴가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학문은 ‘동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시비(是非)를 성찰하는 데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열린 지혜를 모아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데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실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문에 사로잡힌 자는 ‘북스마트’(book-smart, 책상물림)일 뿐이지만, 현실동향만을 좇는 자는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의 ‘밝은 덕을 더욱 밝힘’(明明德), ‘국민과 함께’(親民), ‘지극한 도덕적 선에 머물러 있음’(止於至善) 등의 가치를 배제코자 하는 ‘장사의 작은 기술자’에 빠져 있는 자에 불과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여부를 놓고 그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그 딸과 연계된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벌이고 있는 ‘조국 사퇴 촛불시위’는 ‘선택적 정의’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가 8월 27일 서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게재되었다. 그중 이런 말이 있다.
“우리의 분노를 두고 ‘청년세대의 정의감’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못 본 체하고 모른 체한,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다수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용하기 위한 정의인가 아니면 (우리들만큼은 나름 소소한 승리를 거둬서 학벌 타이틀을 따고 언론들의 주목도 받게 한 현 제도를 강화하는) 더욱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정의인가”
이 글의 게시자는 “조 후보자를 비호할 생각도 없고 나 또한 그가 자녀 문제에 대해 보인 태도에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그간 조국 교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성찰이 너무 부족했다. ‘치인(治人)’의 위치에는 혹독한 ‘수기(修己)’가 따라야 한다. 수기의 修는 몸에 채찍자국이 나게 때려가며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의 가족 특히 그의 딸과 관련돼 보도되고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에 따라 그의 사퇴여부는 결정될 것이지만, 사퇴여부를 넘어서 이미 조국 교수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바둑판의 ‘사석’(死石)이 된 형국이다.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의 덕성과 지혜는 조국의 도덕성이라는 ‘사석’을 버리는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용의 사회적 정의’라는 공공의 이익을 명쾌하게 밝힌 데 있다.
“정작 제도의 바깥에서 제도 안의 다수를 기만하며 군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애써 못 본 체하면서, 제도 안의 우리끼리 서로 끝없이 경쟁하며 고통의 평등주의를 강요하는 악순환의 서커스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닙니까?”
조국 가족의 도덕성, 나아가 법률위반 여부를 비판하는 수기치인과 사회적 정의의 잣대는 ‘나’를 비롯한 대학(인), 지성집단, 언론, 여당, 야당 등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가짜가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진실로 사이비(似而非)가 아니라는 전제이다.

국어국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