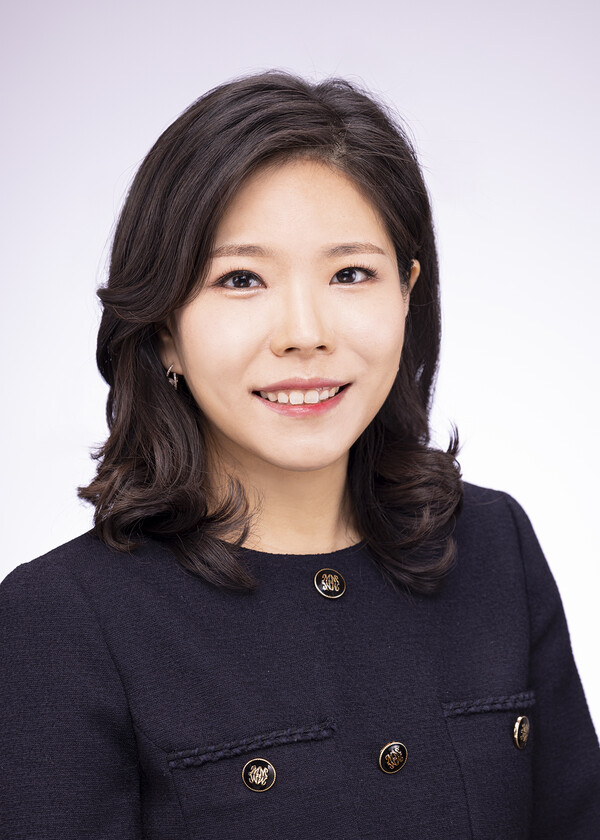지구상의 생명체는 공생, 기생, 경쟁, 포식 등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존한다. 뻐꾸기가 뱁새에게 알의 부화를 맡기는 기생, 호랑이와 같은 대형 포유동물의 포식, 유한한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물종은 다른 종의 상태에 따라 쇠퇴할 위험이 크다. 반면에 꿀을 제공하는 식물과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과 같이 서로 이익을 주는 공생 관계가 안정적 생존의 바람직한 관계로 보인다. 인간과 다른 생물종의 관계는 인간이 진화하면서 일방적 포식 관계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결과적으로 그 폐해가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생물종이 사라지지 않도록 환경보전에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원시 시대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작게는 가족 단위부터 다양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생의 틀을 유지해왔다. 물론 개인 간, 사회 또는 국가 간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공동체나 국가 집단이 통째로 파괴되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인류 경제·사회구조의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학기술 역량과 자본력 등을 기반으로 내 몫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 개개인 간의, 그리고 사회공동체나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소위 무한경쟁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서 인간은 상리(相利) 공생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한 인간 사이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섬세하고 복잡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 단순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감정 소통이 중요하며 경청과 공감은 이러한 감정 소통의 출발점이다. 상대와 공감하는 언어나 행동 표현을 통해 타인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여기에 소통의 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언어는 다른 생물이 갖지 못하는 사고(의사) 전달의 도구이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수단이다. 나아가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음성이나 어휘, 문법체계를 규명하는데 감정이나 문화, 관습 등과 같은 심리·사회문화적 영향 요인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소통의 언어는 고상하고 우아한 언어 구사라기보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 즉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배려의 언어, 공생(共生)의 언어가 아닐까? 물론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라비언의 이론과 같이 비언어적 표현, 즉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되는 공감의 바디랭귀지가 말과 함께 구현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처럼 말이다.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언어와 마주할 기회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그 언어를 통해 풍부한 지식과 드넓은 시야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생의 언어는 사라지고 경쟁과 포식, 파괴의 언어가 넘쳐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치에서, 비즈니스에서, 심지어 가정과 학교에서도 무시와 조롱, 비난의 언어가 쏟아진다.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이익에 반할 때, 또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 별 득이 없다 싶으면 소통의 문을 닫고 배격하면서 거침없이 거친 언어로 표현하곤 한다.
차라리 인공지능(AI) 로봇에게 공감의 언어를 기계적으로 잘 습득시키면 기생과 포식의 수단으로 언어를 활용하는 사람보다는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인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로봇이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감성이 가득한 공생의 언어, 즉 우리 내면의 섬세한 감정을 서로 교류하면서 상대방의 이익도 내 것만큼 존중하는 (상리)공생의 언어가 우리 사회의 당연하고 보편적인 언어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을 가져본다.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화합의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