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국악드라마 '제주선비 장한철 표류기' 리뷰
기자명
엄보람 기자 (maneky20@skkuw.com)
|
종종 문자가 제 에너지를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뮤지컬’이 바로 그런 단어가 아닐까. 1초도 길다는 듯 바쁘게 색을 바꾸는 조명. 온 열정을 발산하는 무대 위 몸짓. 뮤지컬의 화수분 같은 매력은 그 화려한 볼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땐 눈이 예닐곱 개쯤 됐으면 싶지만 청개구리 심보로 눈을 살짝 감아 본다면 어떤가. 참는 것도 잠시 눈앞의 공연에 대한 호기심이 눈꺼풀을 번쩍 들어 올려버린다. 그런 뜻에서 이 별난 뮤지컬은 참 야속하다.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토라진 척 등을 돌리려니 이거 또 은근히 재미 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객에게 신명 난 장구 소리가 으름장을 놓는다. “눈은 됐으니 두 쪽 귀나 내놓으시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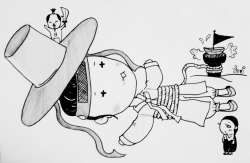
두 귀는 망망대해 저편에 던져두고 나머지는 이 세상에 남겨 놓는 기분. 참으로 묘하다. 돛은 비바람에 미친 듯 춤을 추고 머리 위로 곧 바닷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데 이 모든 것이 귀로만 들리니 애간장이 다 녹는다. 시각이란 놈이 놀고 있다고 해서 몰입도가 떨어지리란 생각은 오산이다. 주르르 풀어내다가 별안간 휙 잡아채는 판소리 자락은 듣는 이를 속수무책으로 쥐고 흔든다.
소리꾼의 목소리가 웃었다, 울었다, 찡그렸다 할 때마다 얼굴은 제멋대로 씰룩이며 주인을 저버리기 일쑤다. 구수하니 신명 나는 대사들은 방심하고 있던 뇌 깊숙이 교훈을 박아 넣는다. 구성지고 애처로운 맛으로 마음 가닥을 건드리는 여창도 얼쑤 좋고 가슴을 뚫을 듯 시원하게 내지르는 남창도 절쑤 좋다. 여기에 개성 넘치는 피아노 선율과 실감 나는 컴퓨터 음향이 세련미를 더하니 이야말로 좋지 아니한가.
한바탕 소란을 다 듣고 나니 뱃멀미가 난다. 웅크렸다 펴내고 몰아가다 뚝 그치는 옛 장단이 젊은 마음을 통째로 들었다 놨다 한 탓이다. 다가오는 한가위, 소리로 엮어 만든 이야기 한 필 선물로 건네 본다. 눈을 감아야 보이는 바다빛깔 비단. 씨실은 판소리 자락이요, 날실은 우리네 풍성한 악기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