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화려함에 가격 부담 증가⋯ 표지, 맞춤 제작 등 여러 대안 있어
서점의 해외서적코너를 돌다 보면 거의 손바닥만 한 크기에 질 낮은 종이로 제작돼 무게마저 가벼운 책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가격이 5천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내가 사려는 국내 책도 이렇게 나온 것이 없는지 찾아본 경험, 당신도 있는가?
이처럼 종이의 질이 낮고 표지 또한 얇게 제작된 책을 페이퍼백(Paperback)이라 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페이퍼백의 책을 제작해 소비자에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다. 국내의 많은 서적도 페이퍼백 형태로 나오지만 해외의 페이퍼백과 똑같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국내 페이퍼백은 색이 화려하고 종이의 질이 좋아 외국의 페이퍼백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나오는데 이를 통해 국내 서적의 책값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가 ‘거품’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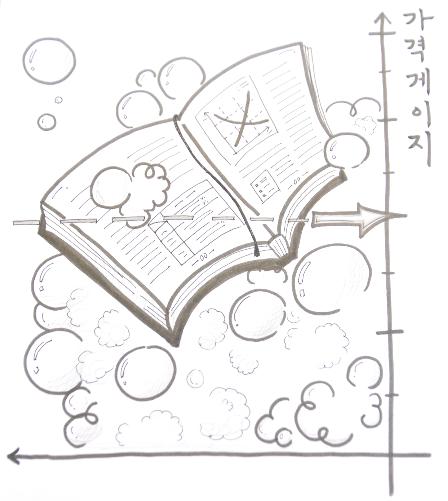
외모지상주의, 이젠 책마저!
실제로 국내에서 출판되는 신간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예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많은 책들은 전면 컬러로 인쇄돼 웬만해서는 흑백 본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많은 신간은 홍보를 위해 ‘…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영화판 국내 첫 개봉’ 등의 문구가 적힌 화려한 띠지를 두르고 있으며 속지로는 표면이 매끄러운 고급 수입 용지가 사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의 표지가 두껍고 딱딱한 ‘양장본’이다. 양장본에 반대되는 것은 얇은 종이 표지를 사용한 ‘지장본’인데 영어로 하드커버(Hardcover)라 불리는 것이 양장본에, 위에 제시된 페이퍼백이 지장본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필요한 요소들 때문에 책의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컬러 띠지를 두르고 컬러로 인쇄된 도서는 그렇지 않은 책보다 제작단가가 평균 4배는 더 높다. 또 양장본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책의 훼손이 적은 만큼 표지를 제작하는 데에만 1~2천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양장본은 고급 용지로, 지장본은 저렴한 용지로 제작되기 때문에 같은 책이라도 양장본과 지장본의 가격 차이가 3만 원까지 나기도 한다.
책이 화려하고 고급스럽다는 것 이외에도 책값에 거품이 끼는 또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대형인터넷서점이 책을 10%가량 할인해주고 배송까지 무료로 해주는 ‘도서 할인제’ 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책값을 할인해주는 것의 부담은 책을 저렴하게 파는 인터넷서점이 아닌 출판사로 간다. 작년 10월 SBS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터넷서점들이 그동안 판촉행사비를 비롯한 갖가지 비용을 출판사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한 것인데 이런 행태는 출판사 측이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높아진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진퇴양난의 대학 교재 값
그렇다면 권당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에 달하는 대학 교재는 어떨까? 이에 대해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등 많은 인문학계열 전공 교재를 출판하고 있는 ‘법문사’ 측은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법문사 측에 따르면 대학 서적은 그 특성상 저작물의 판매 수익 중 저자가 받는 돈인 인세가 가장 높은 출판물에 속한다. 또한 경제학이나 회계학 등 도표가 자주 사용되는 서적은 출판 시 지면을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들은 또한 컬러로 인쇄돼야 하기 때문에 출판 비용이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책값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결정적 이유는 출판사라는 기업이 책이라는 상품을 통해 이윤을 남겨야만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중적인 내용의 여타 단행본에 비해 전문적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 교재는 수요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법문사 측은 “원론과 같은 전공 기반 도서는 그나마 나가는 편이라 하더라도 전공 심화 과목의 교재는 그 수요가 훨씬 더 적다”며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고려하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윤을 잘 내지 못한다 해서 지적 가치를 무시하고 팔지 않을 수도, 그렇다고 학생들을 위해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에 팔 수도 없기에 출판사는 가격 책정에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다.
거품 줄이는 선진 출판문화
이렇듯 책의 가격은 표면적 요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에 △독일 △미국 △영국 등 출판문화가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소비자의 책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표지의 이원화가 있다. 표지 이원화란 말 그대로 책을 양장본과 지장본, 두 종류로 출판하는 것이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Who Moved My Cheese?)』를 예로 들면 이것은 현재 약 10달러 내외의 양장본과 그의 반값인 5달러의 지장본 두 종류가 시장에 나와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대학 교재도 표지 이원화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지장본을 구입하고 도서관은 비싸고 튼튼한 양장본을 구입해 비치해둔다.
이 제도들 중 특히 대학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로는 맞춤형 교재 제작 서비스인 ‘리딩 패킷(Reading Packet)’이 있다. 리딩 패킷은 여러 권의 교재에서 필요한 장만을 뽑아 제본하는 것으로 많은 도서를 부분적으로만 참고하는 대학 수업을 위해 매우 효율적이다. 실제로 리딩 패킷은 ‘커뮤니케이션북스’라는 출판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매 학기 단속 대상이 되는 대학가 불법 제본의 적절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미국의 ‘Chegg’사는 학생들에게 실제 값보다 6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교재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값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는 종이가 절약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책값의 거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물론 책이 화려한 색상과 띠지를 두르게 되는 것은 책을 고를 때 표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책에 담긴 저자의 고유한 사상을 고려하면 결코 비싸지만은 않다는 의견 역시 존재하기에 ‘책이 비싸다’는 것은 일부 소비자의 주관만을 대변할 뿐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책의 내용만을 원하는 독자들이 부가적으로 딸려 오는 책의 화려함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격 부담을 지는 것은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점차 사라져야 할 현상이다. 상품이라는 이름하에 책이 가진 지적 가치마저 가격에 매도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